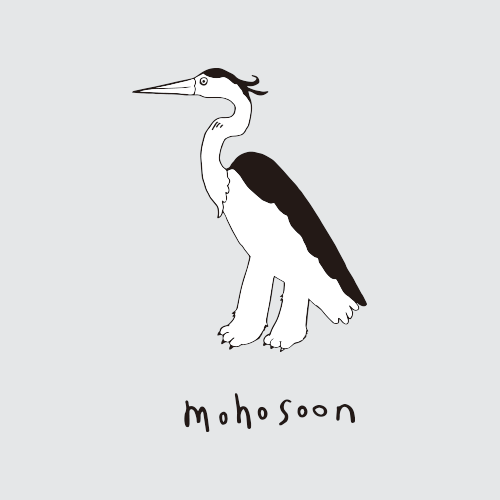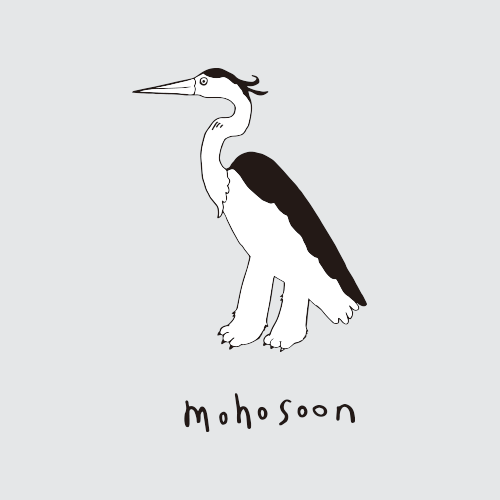003호_25.02.21
살면서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한 편, 음악 한 곡, 사진 한 장씩만 있더라도
|
|
|
5일 남았다. 이번 주 토요일 상영회를 연다. 여기 아이슬란드 이사피에르뒤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다큐멘터리 두 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둘 다 레지던시 중 작업한 것들이다. 한 편은 이곳에서 편집만 진행한 장편으로 을지로에 대한 것이다. 다른 편은 여기가 배경인 짧은 다큐멘터리인데 아직 편집 시작도 못했다. 오늘 모호순 글을 다써내면 내일부터 4일 동안 작업할 수 있다. 대학 때부터 10년도 더 넘게 같은 문제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딱 일주일만 더 있었다면”. 그러나 내가 정한 날짜다. 누굴 탓하리. 살면서 과거의 나를 찾아가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을 때가 더러있는데 오늘 그렇다.
잘 알고 있다. 완성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레지던시 중 해왔던 작업에 대한 소개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인구 2700명의 작은 마을이다. 많이 와도 20명이 될까? 쫄 것 없다. 잘 알고 있다. 영어로 문답해야 하는 큰 떨림이 있는데, 공모 심사도 아니고 내가 찍은 거니 어찌저찌 느릿느릿 답변이 될 것 같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이 영화제 심사위원도 아니다. 이 분들은 지구 반대편 세상 한국 을지로의 골목골목과 친숙한 그들 삶의 터전을 영상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것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상영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나를 소개하고 인사드리는, 마치 일종의 수업시작 전 전학생 자기소개 같은 행사라고 여기고 있다. 아무렴.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가볍게 안 될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감각하는 것에 대한 불일치. 아 어쩌면 그래서 목덜미가 있는 것인가. 목덜미는 분리된 뇌와 심장을 잇는 다리일지도 모른다. 둘은 태초에 따로따로 각자의 기능을 하도록 태어났는데 필요할 때 이어서 사용하라고 목으로 붙인 것이다. 그건 초월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서 목덜미에 신경세포가 그렇게나 많은 것이다. 그만하자. 그래 이 ‘불일치’. 아마도 이 단어가 이곳에서 찍은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 테마에 가장 가까운 키워드일 것이다.
지식은 인식에 앞선다. 지식은 누군가가 이미 정리해둔 것이다. 지식은 글로 개념화, 체계화 되어 논리 안에서 살아남은 것만 지식으로 남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맥락이 탈락한다. 인식은 머리 속 어두컴컴한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뇌가 오감으로 세상을 감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뇌덩어리에 차곡차곡 잠겨있던 지식이 깜짝 놀란다. 어찌됐건 지식도 인식도 뇌덩어리 한 장소 안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엎치락 뒤치락 균열이 생기고 그 틈새가 다른 시선을 뱉어낸다. 그것을 잡아채서 여기 저기 둘러보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집구성을 짜고 추가 촬영도 얼른 해보자. 말은 참 쉽다. 5일 남았다니까. 대학 시절 교수님이 한 말씀 중 영원히 까먹지 않을 구절이 있다. “3일 고민하고, 3일 궁리하였더니 하루 남더라.”
by 모순
|
|
|
1. 금주의 다큐멘터리
빔 벤더스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by 모순
2. 금주의 음악 앨범
Syd Barrett <The Madcap Laughs> by 모호
3. 금주의 사진
<정릉에서> by 모호 |
|
|
제목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감독 빔 벤더스, 훌리아노 리베이로 살가두
연도 2015
길이 110분
관람 왓챠 |
|
|
극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사실 극영화 감독으로 알려진 많은 거장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번 소개했던 아녜스 바르다도 그렇고, 장뤽 고다르도 그렇다.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은 빔 벤더스와 훌리아노 리베이로 살가두(출연자 아들)가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다. 브라질 출신 사진 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의 전기를 다루고 있다.
전기 다큐멘터리는 어려운 장르다. 주인공 신격화 때문이다. 어떤 전기 다큐는 보기 힘들 정도로 출연자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감독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고발 목적이 아닌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인물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특별히 나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좋은 평을 받는 전기 작품은 그 인물을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심어둔다. <제네시스>는 어느 정도 그랬다고 생각한다.
빔 벤더스는 어느날 갤러리에서 살가두 세바스치앙의 사진 한 장에 사로 잡혔고 그 사진을 구매한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빔 벤더스는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농담하자면 성공한 영화감독의 성덕기라고 할까. 사진 작가에 대한 다큐인 만큼 작가의 사진을 보는 재미가 있다. 작가 본인이 직접 사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과정이 영화 내에서 시각적으로 재밌게 표현됐다. 사진 뒤에 갑자기 세바스티앙의 얼굴이 뜬다. 놀랄 수도 있다. 세바스치앙의 사진기가 펼쳐진다.
과연 극영화 감독인가,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끌어가려는 노력이 보인다. 음악을 많이 사용한다. 공들여서 작곡한 티가 난다. 동물들이 등장할 때는 망원렌즈로 당겨서 찍은 쇼트들임에도 동물들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아마 후반 작업에서 입혔을 것이다. 심지어 사진 속 동물에도 동물 소리 효과를 넣었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다. 그 만큼이나 감독이 예술보다 대중적 연출을 고려했던 것 같다.
처음엔 빔 벤더스가 왜 이 사진 작가에 그렇게 빠진지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약간 이상한 작품이기도 했다. 뇌피셜이지만 어쩌면 감독이 세바스치앙과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빔 벤더스도 세바스치앙처럼 자신이 해왔던 주제를 바꾼 감독이다. 이후 그의 영화감독 생활은 힘들어졌다. 최근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퍼펙트 데이즈’의 감독이 빔 벤더스다. 아직 못봤다. |
|
|
트랙리스트
side 1
1. Terrapin
2. No Good Trying
3. Love You
4. No Man's Land
5. Dark Globe
6. Here I Go
side 2
7. Octopus
8. Golden Hair
9. Long Gone
10. She Took a Long Cold Look
11. Feel
12. If It's in You
13. Late Night
|
|
|
앨범 The Madcap Laughs
아티스트 Syd Barrett
발매 1970
길이 37:47
스트리밍 모든 플랫폼
|
|
|
충무로에 위치한 작업실에는 작은 CD 플레이어가 있다. 모순과 나의 것이 섞여있는 CD 더미에서 나는 자주 시드 바렛의 ‘The Madcap Laugh’를 골라 플레이한다. 그 CD는 신주쿠의 디스크 유니온에서 샀다. 수많은 앨범 사이에서 그의 앨범을 발견하고 가슴이 뛰었다. 시드 바렛은 나의 오랜 우상이었다.
|
|
|
대학에 복학하던 스물 넷, 나는 한창 불안에 젖어있었다. 대학 전공이던 생명과학에서 문학으로 도망치려던 시도가 실패했던 것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오는 불안정감이 가장 컸다. 겨우 스물 넷이었지만 당장 무엇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때 살던 곳은 서울대입구역 근방이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아는 곳도 없었다. 서울에서 교육을 받던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방이었다. 나는 그 방에서 소설을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소설을 쓰려고 워드 창을 켜놓으면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대신 산책을 했다. 산책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산책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 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플레이하며 봉천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장을 보는 사람, 술을 마시러 가는 사람, 애인을 만난 사람,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 목적 없이 걷는 나는 그들을 구경하면서 비척비척 걷다가 아무 의자에 앉아 쉬곤 했다.
자주 앉아 있던 곳은 어느 정류장. 이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The Madcap Laugh는 그때 그곳에서 자주 플레이 하던 앨범이다. 그는 나에게 멋지게 슬픈 사람이었다. 그를 동경하고 나를 동정했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언젠가는 저 버스를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돌곶이 집에서 충무로 작업실로 가려면 261번 버스를 타고 한참이다. 버스를 기다리며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서울대입구 역의 그 정류장을 떠올렸다. 나는 왜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지 않았나. 곧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담배를 털고 Terrapin을 흥얼거리며 얼른 버스에 올랐다.
|
|
|
[Terrapin]
I really love you and I mean you
The star above you, crystal blue
Well, oh, baby, my hair's on end about you...
I wouldn't see you and I love to
I fly above you, yes, I do
Well, oh baby, my hair's on end about you...
Floating, bumping, noses dodge a tooth
The fins are luminous
Fangs all 'round the clown
Is dark below the boulders hiding all
The sunlight's good for us
'Cause we're the fishes and all we do
The move about is all we do
Well, oh, baby, my hair's on end about you...
Floating, bumping, noses dodge a tooth
The fins are luminous
Fangs all 'round the clown
Is dark below the boulders hiding all
The sunlight's good for us
'Cause we're the fishes and all we do
The move about is all we do
Well, oh, baby, my hairs on end about you...
I really love you and I mean you
The star above you, crystal blue
Well, oh, baby, my hair's on end about you...
|
|
|
지난여름에서 가을, 정릉3동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곧 재개발로 사라질 정릉동을 아카이빙 하자는 취지에서 성북문화 재단 주최하에 시작된 사업이었다.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 앞서 정릉에 갔다. 가파른 골목길과 텅 빈 집들. 달동네와 재개발 구역에 대해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들의 연속. 온기 없는 파괴된 이미지들. 그날 한참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생각했지만 과연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지 통 몰랐다. 가난과 슬픔, 파괴를 말해야만 하나. 그것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이 다큐멘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실마리를 잡은 건 아직 정릉3동에 살고 계신 정희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였다. 통장님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할머니는 시원한 비타 500을 건네시며 덥지는 않냐고 경상도 사투리로 안부를 물었다. 웃음이 많으신 분이었다. 뒷마당에는 녹색이 가득했다. 정성껏 가꾸는 장미를 비롯한 식물들을 자랑하며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설명하는 나에게 또 웃어주셨다. 그렇게 하라고.
더운 여름을 정릉에서 보냈다. 같이 정릉천을 걷고 북한산도 올랐다. 할머니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멋들어진 모자도 쓰고 염색도 하고 가죽 자켓도 입었다. 저녁이 되면 우릴 보내기 아쉬운 할머니가 집에 문어 무침이 있으니 막걸리를 한잔하고 가라고. 막걸리 두 통을 할머니와 나눠 마시며 취했다 (나는 막걸리에 약하다...).
할머니 재개발돼서 이사 가셔야 하는데 힘들거나 아쉽지는 않으세요?
괜찮아. 이사 가고 다시 놀러 오면 되지.
나는 결국 재개발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는, 식물을 가꾸고 도토리를 줍는, 산책하고 술 마시는 할머니의 하루 파편을 담았다. 할머니가 불행해 보이지 않았으면 했다. 그리고 불행하지 않았다.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상영회를 마치고 한창 부끄러워하는 나의 무릎을 툭툭 치며 할머니는 '고생했어'. 곧 이사를 마친 할머니의 집들이에 가기로 했다. 아마 그날도 막걸리를 마시고 취할 것이다.
|
|
|
ⓒ 2025. mohosoon All rights reserved.
모호 wowtjddnjs@naver.com
모순 dokucity@gmail.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