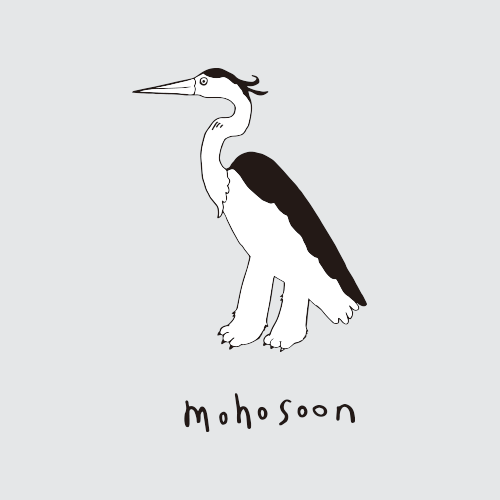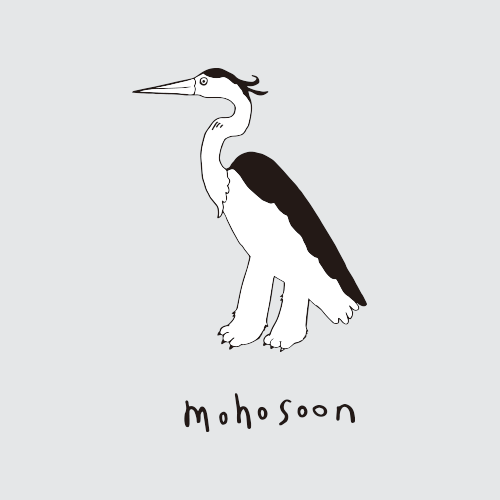영화 ‘물속의 도시’의 오프닝 시퀀스는 새벽녘 푸르른 댐에서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걷는 한 젊은 남성으로부터 시작한다.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아주 가까운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한 그 남자의 나이는 충주댐과 같다.
1985년, 격정의 시대에 완공된 충주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다. 댐 건설로 수많은 실향민이 주변부로 밀려나 아직 그곳에 살고 있다. 영화는 댐을 맴돌며 사람들을 만난다. 아마 그들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언제 마을이 잠겼는지, 어떻게 댐 근처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지, 고향에 어떤 기억을 두고 왔는지. 하지만 인터뷰 대신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본다. 아니, 보여준다. 그리고 진술한다.
한편, 충주댐 위를 거니는 관광선에서 한 라디오 방송을 들려주기도 한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며 폐국된 한 라디오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어 고맙다며 꼭 다시 만나자고, 잊지 말아 달라고 울부짖는 목소리. 댐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목소리는 관광하러 온 이들과 맞물려 먹먹히 휘몰아친다. 그리고 다시 응시하는 실향민들.
나의 할머니의 가족도 댐으로 인해 고향을 잃었다. 장성댐에 마을이 잠겨 가족들은 광주로, 대구로, 전주로, 서울로 뿔뿔이 흩어졌다. 다큐멘터리 취재를 위해 대구에 사는 큰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숨겨두었던 전라도 사투리를 하셨다. 약간의 경상도 억양이 배어있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아득했다. 고향 마을 근처의 산맥까지 외워 물속 어디쯤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큼 선명한 여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조차 없었다. 아마 할머니의 표정도, 일수 할아버지의 표정도, 휴수 할아버지의 표정도 영화 속 그들과 같았을 것이다.
댐을 촬영할 때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과 그 물속에 잠긴 드넓은 땅. 땅을 밟고 서서 물속에 카메라를 겨누고 있는 내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충주댐에는 큰 가뭄이 나면 댐의 바닥이 드러난다고 한다. 실향민들은 그때에 고향을 찾는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나. 물속을 찍는다. 사람들을 만난다. 그럼에도 아마 나는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물속의 도시에서 태어나 아흔 평생을 한 곳에서 산 노인이 있다.' |